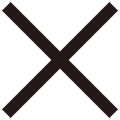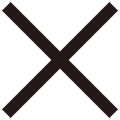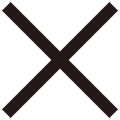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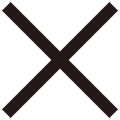
이현지
Hyunji Lee
이현지 박사는 뉴욕대와 미주리주립대에서 미디어·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문화연구자로서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대중문화, 미디어의 세계화, 한류, 그리고 수용자와 팬덤문화 등을 연구해왔으며, 현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연구원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은 물론 강원도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메가스포츠이벤트’이다(김진국·김도훈, 2016).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부터 대다수의 언론은 ‘최대 6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효과로 앞다투어 보도했으며, 혹자는 평창의 역사를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평창에는 ‘세계인의 축제’, ‘국가적인 경사’ 개최를 계기로 제반 시설과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에서 차로 두어 시간을 달려 닿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대함과 화려함 속에 가려진 평창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인 진부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평창 지역문화와 환경을 보존한 채 평창의 정체성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었다. 오대산, 가리왕산 등 6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진부는 해발고도 5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마치 구름과 함께 노니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진부 인구는 약 9천여 명으로, 평창군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창군에 속한 8개의 면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다. 이 글은 강원도 ‘평창’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동계올림픽’, ‘레저스포츠’에서 벗어나, 평창의 정체성을 평창 지역민의 삶터인 진부의 지역성과 시각문화의 특징을 준거 삼아 그 현재적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둔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아래 선명하게 마주한 진부면은 순수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마치 평창의 봉평이 배경이었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온 것 같아, 꼬불꼬불 이동하는 길이 왠지 생소하면서도 친근했다. 이동하는 내내 해안가를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창문너머로 고개를 빼곡 내밀어 보니 바다가 아니고 푸르른 파밭이 필자를 반겼다. 거칠고 투박한 파밭이 어쩜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울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파밭이 어떻게 이렇게 넓게 펼쳐질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했다. 산들바람에 넘실넘실 춤을 추는 평창의 밭은 실로 바다처럼 필자의 마음에도 여유를 주어 설레는 마음마저 들었다.
차에서 내려 마을 이곳저곳을 걷다 보니 읍내 골목 마다 사이좋게 모여 있는 가옥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통한옥, 한옥의 옛 건축 요소들을 일부 보존하며 개조한 건물들, 현대적인 건물들과 밝은 색채의 작은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고 친근한 거리의 고유한 특징을 이뤘다. 특히 오래된 한옥에 노후된 전통기와 대신 최근에 새롭게 얹어진 듯한 강판기와가 고즈넉한 느낌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평화로운 조화 속에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아날로그적 친근감을 더해줬다.
인상 깊었던 것은, 건물들과 가옥들 사이사이에도 크고 작은 밭들이 위치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너른 밭 안에 가옥이 자리 잡은 곳도 있었다. 골목 여기저기를 걸을 때마다 필자가 마주하게 된 다양한 용도와 모양의 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인도의 가로수를 심어놓은 땅에 무심한 듯 핀 파는 가히 ‘강원도의 힘’을 느끼게 해줬다. 예로부터 파는 생명력이 강한 채소로, 땅에 심어만 놓아도 자연의 힘으로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공공 거리에서 마주하니 재밌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평창 지역민들의 강인한 삶을 보는 것 같아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다. 문화연구자 아르준 아파두라이(1996)가 “지역성(locality)은 항상 특정 동네의 지역인들의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p.198)고 설명했듯이, 전통과 현대, 일과 여가, 여유와 치열함이 다양하고 조화롭게 섞여 평창 지역민들의 삶과 이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진부 오일장은 형성된 지 100여 년도 더 된 평창의 대표 오일장 중 하나로, 매월 3·8일 좁은 진부 읍내 끝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메밀부꾸미, 찐옥수수, 올챙이국수 등을 소개한다. 아쉽게도 필자가 진부를 방문했을 때는 텅 빈 장터만 구경할 수 있었다. 눈으로 오일장을 그려 보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구불구불 시골길을 달려 오대산 월정사로 향했다. 월정사 입구에 도착하자 빽빽한 전나무 숲길이 필자를 맞았다. 추운 기후에도 꼿꼿이 자라는 전나무로 이뤄진 숲길을 잠시 걸었다. 전나무 향기와 웅장함 속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산책을 즐기자니 마음이 정화되고 이 세상에 오롯이 나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가 더해져 귀까지 즐거웠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의 본사인 월정사는 평화롭고 전통적이며, 현대적이었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우리나라 유일한 고려 시대 다각 다층탑인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이 재건 중이었는데, 공사를 위해 유리로 막을 친 모습조차 멋지게 느껴졌다.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최근 건립한 현대적인 월정사 박물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창 지역민은 물론 세대를 막론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종교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확장하고 바삐 공유하는 월정사의 모습이 고요한 평창의 모습과 조화를 이뤄 흥미로웠다.
동계올림픽, 레저스포츠의 역동성과 화려함 속에 가려진 평창은 평온하고 강인했으며, 푸르르고 따스했다. 손을 뻗으면 구름이 손에 닿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행복이 가까이 있는 평창. 소박함과 평온함을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평창.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며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평창. 부단함과 여유를 다양한 모습으로 아우르는 평창. 그곳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잔잔하고 사소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강원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참고자료
김진국·김도훈 (2016).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역사회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4호, pp. 379-388.
유현옥 (2021). 축제의 지역성 탐구와 전환 모색 - 춘천을 중심으로 -. 강원문화연구. 제43집. pp. 241-271.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Hyunji Lee studied media/culture and communications at New York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As a cultural researcher, s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dentity. She has explored popular culture, the globalization of media, the Korean Wave, and audiences/fan culture. She is currently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which began on February 9, 2018, and lasted for 17 days, were a “mega sporting event” with effects that extended not only to Pyeongchang but throughout Gangwon-do and its communities (Kim Jin-guk & Kim Do-hoon, 2016). Before they opened, media reported extensively on the anticipated economic effects of up to 65 trillion won; some predicted with certainty that the history of Pyeongchang would be divided into the eras before and after 2018 (the Winter Olympics year). The “global village festival” and “national celebration” led to the expansion of various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Pyeongchang, which continue to have both larger-scale and smaller-scal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n resident lives.
I reached the township of Jinbu-myeon in Pyeongchang, Gangwon-do, after a roughly two-hour journey by car from Seoul. A home to Pyeongchang residents that had been overshadowed by the glitz and splendor of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Jinbu was tenaciously upholding Pyeongchang’s identity, preserving the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even amid these fast-moving currents of change. Ringed by six mountains (including Odaesan and Gariwangsan), Jinbu is located on high ground over 500 meters above sea level, giving visitors the sense of strolling in the clouds. Its roughly 9,000 residents account for over 20% of Pyeongchang’s total population and the largest single population among any of Pyeongchang’s eight townships. In this essay, I would like to look past the things that people commonly think of when they think of Pyeongchang —namely the Winter Olympics and leisure sports—and focus on discovering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Pyeongchang’s identity based on Jinbu’s regional nature and aspects of its visual culture as a living environment for Pyeongchang residents.
Seeing the township of Jinbu-myeon clearly in the blue skies and clean air, I sensed the feelings of pureness and serenity that it emanated. It was as though I had stepped into a scene from Lee Hyo-seok’s story “When the Buckwheat Flowers Bloom” (which is set in the Pyeongchang township of Bongpyeong-myeon): the winding paths seemed at once familiar and unfamiliar. Everywhere I went, I had the sense of strolling along the seaside—but when I extended my head out the window, what greeted me was not the sea, but verdant fields of green onions. “What makes those crude, green onion fields seem so green and beautiful?” I wondered, while also marveling at how broadly they sprawled. Seeing the Pyeongchang fields dancing in the gentle wind, I felt my heart quivering—they really did give me the same feelings of comfort within that I experienced by the sea.
As I stepped out of the car and walked around the village, I saw the houses gathered harmoniously on the town’s side streets. Those roads had a unique quality, charming and familiar, as modern structures and small, brightly colored shops combined with renovated buildings that preserved older elemen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Korean hanok building style. In particular, I noted the serene and contemporary feelings that came from the sheet metal titles, which seemed to have been laid recently to take the place of worn traditional tiles on the old hanok structures. Amid this peaceful harmony, the colorful signs added a note of “analog” warmth.
I was particularly struck by the large and small fields located among the homes and other buildings. In some places, there were even houses located with broad fields. I could not help feeling astonished at the different shapes and uses of the fields that I encountered as I walked through the side streets. I truly sensed the “power of Gangwon-do” in the sight of green onion plants casually sprouting in the spots of land where trees had been planted along the roads. Long known as an especially hardy plant, green onions are renowned for flourishing through the sheer power of nature, wherever they happened to be planted. To see them in public roadside settings was amusing and awkward—and beautiful, in the sense that it felt like I was glimpsing the tenacious lives of Pyeongchang’s residents. The cultural researcher Arjun Appadurai (1996) writes that locality always manifests through the practice of residents in a particular community (p. 198). Tradition and modernity, work and leisure, looseness and intensity—all these things blend in diverse and harmonious ways to shape the lives of Pyeongchang’s residents and the unique flavor of the region.
Jinbu is home to one of Pyeongchang’s leading five-day markets, which is over a century old now. Taking place on the days ending in “3” and “8” of each month at the edge of Jinbu’s narrow length, it shares some of Gangwon’s most representative dishes, including pan-fried buckwheat rice cakes, steamed corn, and “tadpole noodles.” Unfortunately, all I could see when I visited Jinbu was the deserted market site. Forgetting about my disappointment over not being able to see the five-day market for myself, I walked along the winding country roads again as I headed for Woljeongsa Temple at Odaesan Mountain. Arriving at the temple’s entrance, I was greeted by a forest path thick with needle firs. I walked for a bit along the path amid the towering, stretching firs—a tree that goes straight and tall even in high, cold conditions. Taking in the firs’ scent and feeling the cool wind blowing through this majestic setting, I could sense my mind being cleansed through this brief stroll; it was as though I was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It was also a delight for my ears, with the sounds of the birds, the wind, and the babbling brooks.
The home temple for the fourth district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Woljeongsa Temple is peaceful and traditional yet contemporary. At the time I visited, a reconstruction effort was underway for its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National Treasure No. 48), which is Korea’s only multi-sided, multi-story pagoda dating from the Goryeo era. Even behind the glass construction screen, it was stunning. I was also fascinated by the ways in which the tranquility of Pyeongchang harmonized with Woljeongsa Temple, which has been working hard to share and to broaden understanding among regions and religions while connecting actively with Pyeongchang residents and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backgrounds through social media, a contemporary temple museum that was recently constructed, and temple stay programs designed for various age groups.
The Pyeongchang overshadowed by the dynamism and splendor of the Winter Olympics and leisure sports was a setting that was serene and tenacious, green and warm. There was such a sense of happiness close by that I felt I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clouds. Pyeongchang exemplifies simplicity and serenity as a way of life; it is a place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exist in communion, converging with different realms. It is a place that combines hard work and leisure in diverse ways. I could sense the “power of Gangwon-do” in the quiet, small-scale ways that it has preserved its local identity even amid the currents of change.
Reference
Kim, Jin-Kook·Kim do hoon (2016).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and Pyeong-Chang Olympic-gam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5, no.4, pp. 379-388.
Yoo Hyun-Ok (2021). Studying the Regionality of Local festivals and Exploring Their Transition – Focused on Chuncheon Area. The Journal of Studies in Kangwon Community Culture. Vol.43. pp. 241-271.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유영이
Yoo Young Yi
유영이는 밀라노 공대와 서울대에서 건축과 전시를 전공한 후, 글을 짓고 공간을 기획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간다. 도시 공간과 기술, 일상,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저서로는 <다이얼로그: 전시와 도시 사이>, 공저 <팬데믹 도시기록>, <공공예술로서의 조경> 등이 있다.
1967년 한 남자가 한적한 마을의 기차역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 조용한 들판으로 걸어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잔디밭 위를 걸었다. 특별할 것 없는 걷기에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았다. 푸른 잔디밭 위를 걸으니 잔디가 밟히고 흙이 드러나 작은 길이 만들어졌다. 남자는 이 길을 한 장의 흑백사진에 담았다. A line made by walking. 영국 작가 리차드 롱(Richard Long)의 작품이 탄생한 순간이다.
우리는 이동과 사색, 건강을 위해 걷는다. 각자 다른 이유로 걸음을 행하며 땅과 만난다. 리차드 롱이 예술의 범주로 이끈 대상은 지극히 평범한, 하지만 그래서 더욱 고귀한 일상 그 자체였다. 우리는 매일 삶을 행하며 공간을 변화시킨다. 걸음 하나하나에 반응한 땅이 있고, 앉았다 일어난 의자엔 온기가 남는다. 내 책상, 내 침대, 내 집엔 더욱 나의 일상이 진하게 녹아있다. 하루하루가 녹여진 그 공간엔 나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다.
일상이 직조한 공간
안개가 걷힌 후 대관령의 푸르름을 만난 날, 창문을 내리니 촉촉한 공기에 푸르른 파 향이 진하게 몰려왔다. 파 수확이 한창이던 진부는 수확이 끝난 밭은 황토색 물결과 수확을 기다리는 초록빛이 어우러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문득 ‘이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위성지도로 보면 초록색, 황토색 땅이 보이고 흙과 작물의 질감을 조금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지도에 지금 이 풍경이 놓인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의 꼬리는 지도를 배웠던 어렸을 적 학교 수업까지 이어졌다. 가운데 긴 막대기를 그리고 양쪽에 짧은 막대기를 그리면 밭을 의미하는 기호가 된다. 논은 서 있는 막대기 두 개와 누워있는 막대기가 하나이다. 누워있는 막대기가 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지도 기호를 외운 기억이 난다. 막대기 3개. 밭은 마치 땅에 사람이 작물을 심듯 3개의 풀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밭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냥 평평한 땅에 식물을 심는, 그렇게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둘 가꾸어 나간 흙과 계절을 난 작물이 만나 밭을 이루고 있다. 흙과 작물의 사이에서 정성스레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사람 또한 밭에 녹아있다. 어쩌면 지도 위에 있는 세 개의 막대는 흙, 작물,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사람과 자연, 경계의 땅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인공적인(Artifici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또 다른 가치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Art의 어원은 ars, 배움과 훈련의 결과로 얻어진 기술을 의미한다. 이 단어에는 시간과 노력이 숨어있다. -ficial은 라틴어 facere, ‘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결국 영어의 ‘인위적인‘이라는 단어는 한번 단순히 해본 체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누군가의 숙련함이 엿보인다.
15세기 초, 영어에서는 하루 중 해가 뜬 시간은 artificial day, 이와 대조되는 하루 24시간을 natural day라 칭했다고 한다. 마치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을 사람이 행동하며 무언가 배우고 축적해 나가는 시간으로 의미했던 것 같다. 16세기를 지나며 자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었다. 순응하고 지켜나가야 했던 자연이 이제는 인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요소로 점차 변화해나간 것일까. 하지만 인위적이라는 표현에 사람의 노력, 땀방울이 맺혀있다고 하니, 밭을 가장 인위적인 풍경이라 칭송해도 좋을 것 같다. 배움과 훈련의 결과로 얻어진 기술을 행하여 만든 땅. 밭은 가장 인공적인,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진부의 풍경으로 다가온다.
일상을 소비하다
진부에서는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옥수수가 도맡고 있는 듯하다. 옥수수마저 없으면 길가에 서서 너른 밭은 바라보고 있자니 뭔가 허전하다. 민망함을 알기라도 한 걸까. 월정사 가는 길에 놓인 까페는 그 밭을 바라보고 있다. 당근 주스와 케이크가 발길을 붙잡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밭을 바라보는 이른바 밭뷰가 이 근방 카페의 인기 요인이다. 시원한 바람이 가득한 실내에서 커피 한잔에 바깥을 바라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몰려온다.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는 기분, 누군가의 일터를 지긋히 감상하는 그 순간이 커피 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곳은 마치 누군가의 집이어야만 할 것 같고, 나아가 밭 주인의 집에 초대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주변을 둘러보니 밭 한가운데 집이 서 있다. 아니 너른 밭 한가운데 집이 포근히 안겨있는 듯하다. 아마도 밭 주인은 저 집주인이 아닐까. 아마도 이 까페도 한때 누군가의 집이고 그 앞마당이 밭이었을 듯하다. 수원 화성 주변의 행궁뷰 때문에 까페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임금의 공간을 보는 것처럼 이곳에선 누군가의 땅을 바라본다. 그 앞에 파를 다듬고 있는 할머니께서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이 밭에 뭐 볼 게 있다고 그 값에 커피를 마싯사”
진부(珍富)다운 땅
밭을 초록색으로 칠하며 드넓은 벌판처럼 묘사했던 꼬꼬마 어린 시절,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 땀방울과 시간, 정성이 묻어나는 밭의 풍경이 더욱 정겹다. 밭을 가까이 가서 보면 길이 나 있다. 마치 리차드 롱이 왔다 갔다 하며 만들어낸 작품처럼, 밭에는 농사를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가지런히 나 있다. 그에 따라 작물도 땅의 모양을 따라 가지런히 일렬로 서있다.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풍경이 또 있을까. 무언가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진부 사람들의 삶이 이 정돈된 땅에 한 땀 한 땀 녹아있다. 마치 사람과 하늘, 자연을 잇는 수를 놓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땅 위에 예술처럼 오롯이 새겨져 있다.
Yoo Young Yi studied architecture and exhibitions at the 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is currently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that include writing and spatial planning. With interests that include urban spaces, technology, daily life, and people, she has written the book Dialogue: Between Exhibitions and Cities and co-authored the books Pandemic City Record and Landscaping as Public Art.
In 1967, a man arrived at a train station in a secluded village. After stepping off the train, he walked to a quiet field, where he took one step after another over the grass.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his walking, and it did not attract anyone’s notice at the time. As he stepped over the green grass, a small path formed where the grass was pushed down and the earth exposed. He then captured the path in a black-and-white photograph. This was the creation of A line made by walking, a work by the British land artist Richard Long.
We walk to go places and to think, and we walk for our health. Taking steps for different reasons, we come in contact with the earth. Long’s focus—the thing that he ushered into the category of “art”—was everyday experience as something exceeding ordinary, yet all the more precious for that. Each day, we alter spaces through the actions of our lives. The land reacts to each of our footsteps; warmth lingers on the chair where we were sitting. Our everyday activities are deeply imbued in our desks, our beds, and our homes. Marks unique to us form layers on the spaces suffused with our day-to-day experience.
The spaces that daily experience weaves
On the day the mist cleared and I saw the greenness of Daegwallyeong Pass, I rolled down the window and was struck by the thick fragrance of green onions in the moist air. Jinbu was in the middle of its green onion harvest, and the combination of the waves of red clay in the harvested fields and the green of those awaiting harvest told a story about the flows of time.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What does this landscape look like when seen from the sky?” Looking at a satellite map, I might see the green and red land and distinguish some of the textures of the earth and the plants. What would it look like if the landscape at that moment was captured in a map?
The chain of imagination took me back to when I was a child learning about maps in school. To make a symbol representing a “batt,” you draw a long bar at the center and short bars on either side. A rice paddy consists of two standing bars and one lying bar; I can remember memorizing the map’s symbol by imagining that the lying bar signified “non(rice field).” Three bars—that seemed to represent three blades of grass, like a person had planted crops in the batt. But when I looked closely at the batt, I did not see anything so simple as “plants planted in flat earth.” The fields took shape as crops whose season had come combined with the spots of cultivated earth. Also imbued in the land were the people who had devoted so much time and energy to the earth and the crops. Perhaps the three bars on the map signified “earth,” “crops,” and “people.”
Land of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word “artificial” carries something of a negative connotation. But if we look at the roots of the word “artificial,” we can see that it expresses a different sort of value. To begin with, ars (the root behind the “art” portion) refers to techniques acquired through learning and training. Concealed within this world is a process of time and effort. The “-ficial” part comes from the Latin word facere, meaning “to make or do.” In the English word “artificial,” what we see is not an experience that someone is simply trying out, but a glimpse at skills acquired by someon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early 15th century English, the term “artificial day” was used to refer to the time during the day when the sun was out, while the contrasting term “natural day” was used for the span of 24 hours. This seemed to convey the sense that the waking hours of the day were time that people spent working, learning, and gaining experience. It was over the course of the 16th century that the idea of something potentially “replacing nature” became incorporated. Perhaps this represented a gradual transformation in nature from something to be obeyed and preserved into something that could be replaced by human beings. But in light of the human effort and toil that the term “artificial” connotes, the field can be lauded as the most “artificial” of landscapes. This is land cre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kills gained through learning and training. The field is the most artificial landscape of Jinbu, and its most quintessentially “everyday” scene.
Consuming the ordinary
In Jinbu, corn stalks seem to play the role of obscuring the field of vision. If it weren’t for the corn, there would be something somehow hollow about standing on the roadside looking out at the broad fields—perhaps a sense of embarrassment. There is a coffee shop on the road to Woljeongsa Temple that looks out over the batt. Maybe the carrot juice and cake go some way in enticing people there, but the view of the batt is one of the big draws of this nearby café. There is a curious feeling that comes over you as you look outside while sipping coffee in an indoor setting filled with the crisp wind. The feeling of sneaking a peek at someone else’s life—of furtively taking in someone else’s place of work—does not go well with the aroma of coffee. I feel as though this place should be someone’s home, as though I ought to be invited to the home of the person who owns the field.
As I walked around, I saw a house in the middle of a batt. It seemed quite cozily ensconced in the middle of a field’s broad expanse. Perhaps the field’s owner and the home’s owner were one and the same. The café may have been someone’s house at one time, and its front yard may have been a batt. I heard the coffee shops around Hwaseong Fortress in Suwon enjoyed a boost thanks to the view of the Haenggung Temporary Palace there; looking at someone else’s land here is like looking at a space reserved for the king. Perhaps the old woman trimming green onions in front of me would be a bit bemused: “What is there to see in that batt for them to drink coffee at those prices?”
Quintessentially “Jinbu” land
I saw traces of people I never got to meet in my younger days, when I painted batt of green like broad plains. The batt landscapes are all the warmer for the marks of toil, time, and dedication. As I approached a batt, I saw the paths running through it. Much like the work that Richard Long created with his back-and-forth movements, a neat trail was formed as the farmers moved back and forth over the field. Along its length, the crops also stood in tidy rows, following the shape of the land. Is there any other landscape so exquisitely refined? The lives of the people of Jinbu—their planting, cultivating, and harvesting—suffuses every corner of this well-kept land. Like an embroidery connecting people, heaven, and nature, ordinary lives are artistically engraved upon the soil.
김소정
Kim So Jung
김소정은 평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 강원작가트리엔날레2022 코디네이터이다.
한평생 시골에 살았더라도 맑은 날 밭 전경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가을의 농촌은 유달리 아름답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황금빛 들녘과 오색 단풍을 실제로 마주하면 그들의 아우라에 무의식적으로 감탄하게 된다. 거대한 작품을 마주했을 때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듯 농경의 모습은 감정을 휘몰아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내 잔잔한 사색에 빠지게 한다.
그러한 감상과 비슷하게 2미터가 족히 넘는 평창의 옥수수밭을 보고 있노라면, 대형 오브제를 보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진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턱이 없다. 옥수수밭을 보며 공상에 잠겨있는 와중 빽빽한 이파리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다. 식물로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은 인간을 제외한 이들의 전유이다. 어느 날 그 옥수수밭을 다시 지나가니 옥수수는 흔적도 없고 아파트 공사 현장만이 남아있었다. 오직 인간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한편, 평창 시내 한가운데 있던 어느 아저씨의 집은 어느새 밭이 되어있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 등장인물이 밭에서 토마토를 따 먹고 남은 꽁다리를 아무렇게나 밭에 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장면은 시간이 흘러 그 꽁다리에서 줄기가 자라나 새 토마토를 따는 것으로 이어진다. 농촌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다. 저녁을 먹기 전 집 앞에서 고추 몇 개를 따고, 저녁을 다 먹은 후 남은 잔반을 바로 옆 밭에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가 되어 내후년에는 다시 그 밭에서 새로운 작물이 자라나게 한다. 밭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새로운 생명이 씨앗을 틔우다가도 죽은 것의 부산물이 여기저기 널린다. 지나가는 강아지의 화장실이면서 인간들의 식료창고이고, 버려지는 땅이다가도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지어진다. 밭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미묘하게 드나들며 알 수 없는 생기를 띈다.
강원작가트리엔날레2022 아트-밭 전시에 참여한 강원대, 강릉원주대 학생 작가들이 아티스트 토크를 했다. 토크 중간에 참여 작가 중 한 명이 트리엔날레 참여 소감을 밝혔는데, 홍천에서 열린 강원트리엔날레 관람을 계기로 예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전공을 변경하였고, 현재 조소를 전공하고 있으며 트리엔날레에 학생 작가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작품은 아트-밭 밭이랑의 캔버스를 좌대 삼아 설치-심어졌다. 녹슨 쇠못, 톱니바퀴, 쇠사슬을 비롯하여 석고로 만들어진 작품은 언젠가 흙의 형태였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밭이라는 순환 고리와 같이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탄생시킨다. 자연물로 만들어져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는 작품들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만의 따뜻한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미래의 어느 때, 다시 생명이 될 잠재력을 지닌 것들은 온기를 내뿜으며 공간을 덥힌다. 해발 고도 500미터 시린 바람이 끝없이 부는 이곳 평창에서 왜인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지는 까닭은 공간을 둘러싼 밭의 생기 때문일 것이다.
Kim So Jung was born and raised in Pyeongchang. She is currently a student of visual cultur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a coordinator for Gangwon Artists Triennale 2022.
I’ve lived in rural settings throughout my life, yet I never fail to be astonished when I see the panorama of a field on a clear day. Rural landscape are especially beautiful in the autumn. Even when the “golden fields” of the fields and the “five colors of the autumn leaves” have become something of a cliché, the aura of the real thing elicits an unconscious gasp. Like the heavy feeling we get in our hearts when we stand before an enormous work of art, the sight of the farms stirs up the emotions—and sends me into a state of quiet contemplation.
In a similar way to that experience, the sight of Pyeongchang’s fields of corn growing over two meters high carries all the grandeur of beholding an enormous art object. We cannot venture inside ourselves to what things might be happening within. As I was looking at one cornfield, lost in my reverie, I saw a cat come bounding out from among the thick leaves. The secret space created by the plants was purely for them, and off limits to people. One day, I was passing by the site of the cornfield, only it was gone without a trace; in its place, there was only the construction site for an apartment complex. It has become a place that only human beings could visit. Meanwhile, the home of one man in the center of Pyeongchang was transformed into a field.
In the movie Little Forest, there is a scene where one of the characters picks and eats a tomato from a field and then casually throws the rest back into it. The scene goes to show a stem growing from the discarded tomato over time, becoming a new tomato that someone else picks. It’s a familiar landscape for someone like me who was born and raised in a rural community. I would pick a few peppers from in front of our house before dinner; once we were done eating, I would toss the leftovers into the field right next to us. The discarded food acted as compost, helping new crops grow in the field over the next few years. In fields, there is an endless cycle. Even as new life is budding, the by-products of dead things are strewn all about. For a passing dog, it is a toilet; for human beings, it is a pantry. The fields can be abandoned land and also can be a home for someone.It exists as abandoned land before becoming a home for people. Delicately straddling the boundary between the natural and artificial, fields take on an indefinable vitality.
For the Gangwon Artist Triennale 2022 Art-batt exhibition, there was an artists’ talk given by participating student artists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talk, one of the artists shared their reaction to taking part in the Triennale. Explaining that she had changed their major after seeing the Gangwon Triennale in Hongcheon and decided that she wanted to be an artist. She said she was now studying sculpture, which was how she came to take park in the Triennale as a student artist. Her work was displayed/implanted in batt’s field ridge canvas, which provided a kind of pedestal. Created with rusted nails, cogwheels, chains, and plaster, the work retained the shape of earth, and it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earth. Much like the cycles of the fields, art produces new artwork and artists through the mutual influence Artwork that is produced as something natural before undergoing artificial processes blurs the boundary between “nature” and “artificiality,” generating its own unique, warm aura.
Things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life again sometime in the future cover their space, emanating warmth. The reason why we can feel the unknown warmth in Pyeongchang, 5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cold wind is constantly blowing, may be because of the creationg of fields surrounding the space.